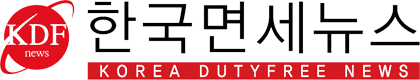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는 3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11월 29일자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게시된 "단독! 김현중 충격적 양육비.. 8년만에 만난 아들이 상처받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근거로, 김현중 씨에 대한 터무니없고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영상에서는 김현중 씨가 마치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통해 일단 김현중 씨가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비 지급이든 면접 교섭을 진행하든 할 수 있다"며 "김현중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와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단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네치아는 "2021년 가을, 김현중 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정 법원에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관련신청을 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에 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때 비양육자는 아이의 면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김현중 씨는 최 씨(김현중의 전 연인)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싶었다. 아이는 면접교섭을 통해 하루 빨리 만나고 싶었으나 최 씨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 이 사항을 별도로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현중 씨가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면접 교섭을 같이 신청하는 길 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김현중 씨가 먼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면접교섭 및 양육비 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이다. 아이를 너무 보고 싶었던 김현중 씨가 기다리다 못해 면접교섭 신청과 양육비 신청을 동시에 법원을 통해 진행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현중 씨는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면접교섭이 진행되어 드디어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며 "조정 과정에서 최 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고, 김현중 씨는 양육비 20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상에서는 김현중 씨가 양육비 200만 원을 줄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 역시 거짓말"이라며 "양육비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부와 모 양쪽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를 당연히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서류에 의해 양육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최 씨는 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었고, 조정 과정 중 법원에서 임시로 결정한 200만 원에 대해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김현중 씨의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김현중 씨는 최 씨 요청에 따라 최종 양육비 결정을 위해 당연히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권고결정한 양육비가 160만원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현중 씨는 이미 8살이 된 아이가 다시 언론에 노출되어, 쏟아지는 기사들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우려해 언론 노출을 피하려 극도로 노력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포함해 지금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고, 면접교섭 및 양육비 문제도 법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 관계를 나열했다"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